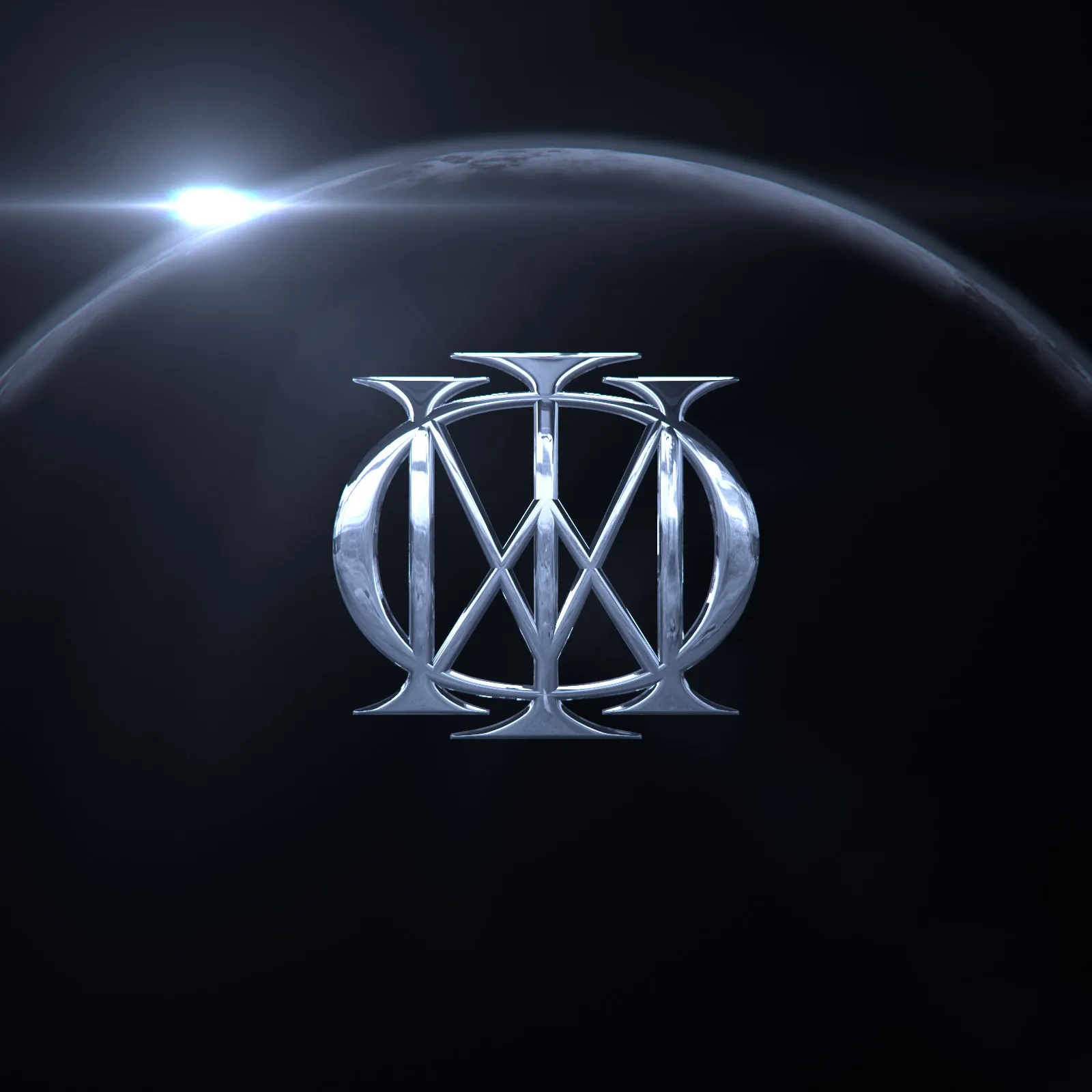아 끈적거려. 방금 전에 저녁 겸 야식으로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 국물이 키보드에 튄거 같다...
위에서 '끈적'을 쓸까, '끈쩍'을 쓸까 한참 고민하다 사전 찾아보니 '끈적'이 맞아서,, 그리고 내 발음을 다시 확인해보니 전자가 맞는거 같아서... 최종 '끈적'으로 확정했다. 이토록 고민했던 이유는 마침 그제가 한글날이었으니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유일로 돌아온 한글날 만세(어떤 정신나간 놈이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었는지! 뒤늦게 나마 정상으로 돌아온 거 매우 기쁘다).
말이 나온 김에 맞춤법에 대해 잠시 논하자면, 표준어랍시고 방송인들이 쓰고 말하는 '자장면' - '짜장면'이 아니라. 이 거 그야말로 코미디. 일단 정답부터 보자면 '자장면'이나 '짜장면'이나 둘다 표준어라곤 한단다.
된소리는 듣기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자장면'을 사용한 거 같은데, 우리가 언제부터 짜장면을 '자장면'이라 불렀냐. 언어는 변하기 나름이고 그러한 변화에 대해 '자장면' 같은 인위적인 action을 가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인위적인 action은 소위 '자연'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이를 놔 두고 수용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단 생각. 더군다나 명확한 음절 구분이 가능한 한국어에선 말이다(뉘가 말했는지 기억 안나지만 고상한 말로 - 언어는 생명체다 - 라고 한다더만, 이건 뭐하는 닭살 돋는 표현인지).
여튼,,, 주제완 거리가 한참이나 먼 헛소리는 이제 그만 접고, 본 포스트 타이틀 - Dream Theater 신보에 대한 썰로 본격 start.
Dream Theater의 self title 신보 앨범 커버. 난 이 커버를 보고 당장에 Pink Floyd의 The dark side of the moon - eclipse를 떠올렸다. 하긴 Dream Theater의 The dar side of the moon 커버 앨범도 있다만.
일단, 이 앨범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A dramatic turn of events를 끼고 살고 있었는데, 이 말은 신보가 상당히 빨리 나왔다는 뜻임과 동시에, 그 만큼이나 위 이전 앨범이 좋았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나름 찾아가면서 듣는 편이라도 10대 애들처럼 앨범 기다리고 이런 건 안한지 오래되었는데, 우연찮게 이 앨범 소식을 사전에 듣다보니 나도 모르게 나오길 기다렸다는 거.
첫 싱글이 두 번째 곡인 The enemy inside... 앨범 나오기 전 뮤직비디오로 먼저 보았고, 그 첫 느낌은 '그저 그렇군...'. 그런데 왠걸, 앨범 전체 정독... 이 아니라 정취를 했을 때는 '헉 대박인걸'. 뮤직비디오로, 구린 음질로, 대강 들었을 때의 느낌와 이렇게 차이가 질 줄이야.
두 번째 싱글은 Along for the ride인 것으로 안다만, 이건 마지막 22분짜리 마라톤 곡 바로 앞에 위치하는데, '편한데 진부함은 어디로 갔나. 첫 번째 무한 반복 곡이 되겠구나'가 두 번째 생각.
왠지 모르게 Images and words - Surrounded를 자꾸 떠올리게 하던 세 번째 곡 The looking glass. '앨범 시작하자마자 세 곡 연달아 hit이라니. 앞으로 곡 골라서 들을지 전체를 그냥 들을지 고민이겠군'이 세 번째 생각. 접한지 대강 스무여일 지난 지금은 거의 골라 듣고 있다만.
마지막으로 22분짜리 Illumination Theory 앤딩 곡. 여전히 노가다가 필요한 곡이다만 뒷 부분 클라이막스는 이제 좀 익숙해지는거 같네. 근데 이 장고를 이루는 곡 존재 자체만으로도... 뭐랄까 대박임을 확정한다할까나?
사실, 2분여의 prelude 연주곡에 해당하는 첫 번째 곡 False Awakening Suite를 듣자마자 '또 대박 났군, 만세!'라 맘속으로 소릴 질렀다는게 진실이고, 위 첫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야긴 한참을 듣고 난 이후의 정리된 생각들. 첫 곡만 들어도 이게 대박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나의 센스가 돋보인다는 것이 핵심? ㅋ
여튼 다 집어치우고 이 앨범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강하지만 세련됐다.
글구 그 뒤로 바로 한마디 더 붙이자면,
난 언제 이 앨범 연주해보나.
(아주 테크닉으로 떡칠을 해놨다는. 초절정 고난이도 - 참고로 여기서 '떡칠'이란 표현은 그들의 능력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기 위한 반어법에 해당 ㅋ)
간만에 온몸의 전율(상투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느낀...)을 느끼고, 감동의 눈물 한바가지가 눈에서 튀어나올랑 말할 한거 겨우 참았다....라고 쓰면 글 구성이 좀 이상해지는데. 하지만 그게 진실인걸.
위키피디어를 좀 뒤져보니 아래와 같은 설명이 붙는다.
지난 앨범(A dramatic turn of events)은 상당 부분이 drummer 공백 상태에서 만들어진거라 drum 파트를 Petrucci가 프로그래밍하고, 막판에 영입된 Mike Mangini가 프로그래밍된 악보를 따라 친건데, 이번 앨범에선 Mangini가 '당연히' 모조리 drum 파트 작곡했다는. 그 결과에 대해 Petrucci는 Mangini Unleashed란 표현을 써면서 그를 극찬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 앨범에서 drum이 걍 무난... 안튄다..란 느낌이었는데, 이번 앨범은 화려함이 아주 돋보인달까? Mike Portnoy 시절의 화려함이 안부러운 그런 생각.
p.s. 아... 이 글 쓰는데 20여일 걸렸다. 이 p.s.를 쓰는 날짜는 10월 27일. 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