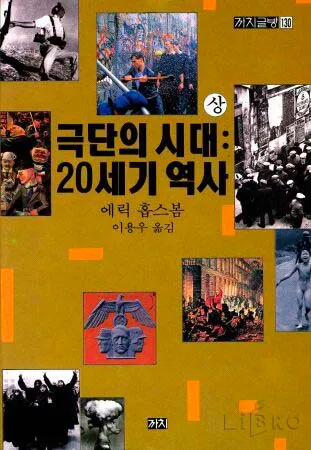'자본의 시대'와 '제국의 시대'를 건너뛰고 바로 '극단의 시대'로 넘어갔다. 어떤 형태건 '혁명의 시대'를 한번 다 흟었다는 것만으로도 내겐 뿌듯한 일. 본 '극단의 시대'는 책 제목만큼이나 드라마틱한 시대 - 내가 얼마간이나마 동참했던 시대 - 20세기 - 인지라, 의미가 어찌되었건 간에 18세기 말 ~ 19세기 초를 다룬 '혁명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잘 읽힌다.
하나 중요한거. 저자가 일반인을 위해 쉽게 썼다 하더라도 감히 '서평'을 쓸 생각은 못한다. 이 책이 다루는 범위는 내 지식 한계선을 넘어서도 한참이나 넘어선다. '독후감'도 안된다. 글을 구성하느라 밑줄그어가며 다시 책을 뒤져보는 인내심까지 가질 필요까지는 못 느낀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끄적임 정도랄까. - 이걸 뭐라 부르지? -
극단의 시대 (상): 에릭 홉스봄
촘스키 옹을 통해 알게된 에릭 홉스봅의 '극단의 시대'. 프랑스에서조차 좌파, 빨갱이의 냄새 때문에 처음 발간된지 5년이나 지나서야 발간되었다던 책. 그렇게 자극된 호기심 뿐 아니라 근, 현대사에 대해 너무 무지한게 아닌가 싶어, 촘스키 옹처럼 어렵지 않게 상식적으로 역사를 잘 풀어내지 않았을까.. 좌파 성향 학자 특유의 쌈박, 명쾌한 설명이 기대되기에 산 책이다. 알고보니 본 책은 시리즈 물이었고, 이 시리즈 물은 프랑스 혁명 시기부터 시작한 '혁명의 시대'부터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마지막으로, 2차 세계 대전을 거쳐 1990년까지 다룬 본 극단의 시대까지 4부작에 달한다.
반을 좀 넘어갔는데 기대했던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묘사는 없고 어느새 냉전 바로 전시기에 다다렀다. 하기사.. 혁명의 시대에서도 그랬지만 사건의 나열, 묘사는 독자 배경 지식으로 간주한 채 사건의 원인 분석이 주된 내용 이었으니.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자가 왕년에 한 마르크스주의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좌파와 (적어도 스탈린 이전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묘사한다. 내 성향도 성향이겠거니와, 시대 영향도 있겠거니와, 그리 묘사한 데 대해 그리 불편한 감정이 생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 참신함을 느낀다고나 할까.
2차 세계 대전 전에 불어닥쳤던 대공황이 히틀러의 독일은 비껴갔다고. 1차 세계 대전으로 쑥대밭이 되었던 독일이 그리 빨리 성장하고, 대공황도 남의 일인 듯 넘겨버리고. 그래서 그 당시의 그쪽 사람들이 나찌-파시즘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기까지 했었다고 한다. 납득이 갈만하다.
Der Untergang(몰락)
제목만 보고 그냥 보았던 영화인데 아니 이렇게 괜찮은 영화일 줄이야. 한 서너번은 본거 같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의 얼마간과 자살 후의 얼마간을 그린 영화. 원작은 본 영화의 주인공인 크라우들 융에의 회고록이라고. 22살에 히틀러의 여비서로 들어가 나찌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전혀 모른 채 히틀러의 인간적 매력에 취해 자살 전까지 있었다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야 나찌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때서야 알고 죽기 얼마전까지의 인생을 자책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영화 자체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거니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서 나오는 그녀와의 인터뷰 내용이 맘에 상당히 와닫는다. 놀라왔던 것은 히틀러 주변 사람들, 특히 그녀에게 비친 히틀러의 모습은 매우 매력적이었다는 것. 자기 절제에서 나오는 압도적 카리즈마로 해석해야 하나? 채식주의자, 독일 국민과 결혼했기에 여자를 두지 않는다는 모습.. 주위 참모들에게도 상당히 인간적, 비권위적으로 행동했다고. 다만 영화에서는 이러한 모습의 히틀러가 보이지는 않는다.
동시대를 다룬 두 작품을 거의 동시에 보아서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잘 읽힌다. 아, 또 하나. 히틀러의 실제 사진을 보니, 찰리 채플린이 아닌 더스틴 호프만과 상당히 닮았다. 더스틴 호프만에게 콧수염을 붙이고 기름을 듬뿍 뭍혀 9:1 가르마로 머리를 붙히면 거의 똑같을 듯. 그만큼이나 생각외로 잘생긴 히틀러로 보인다.